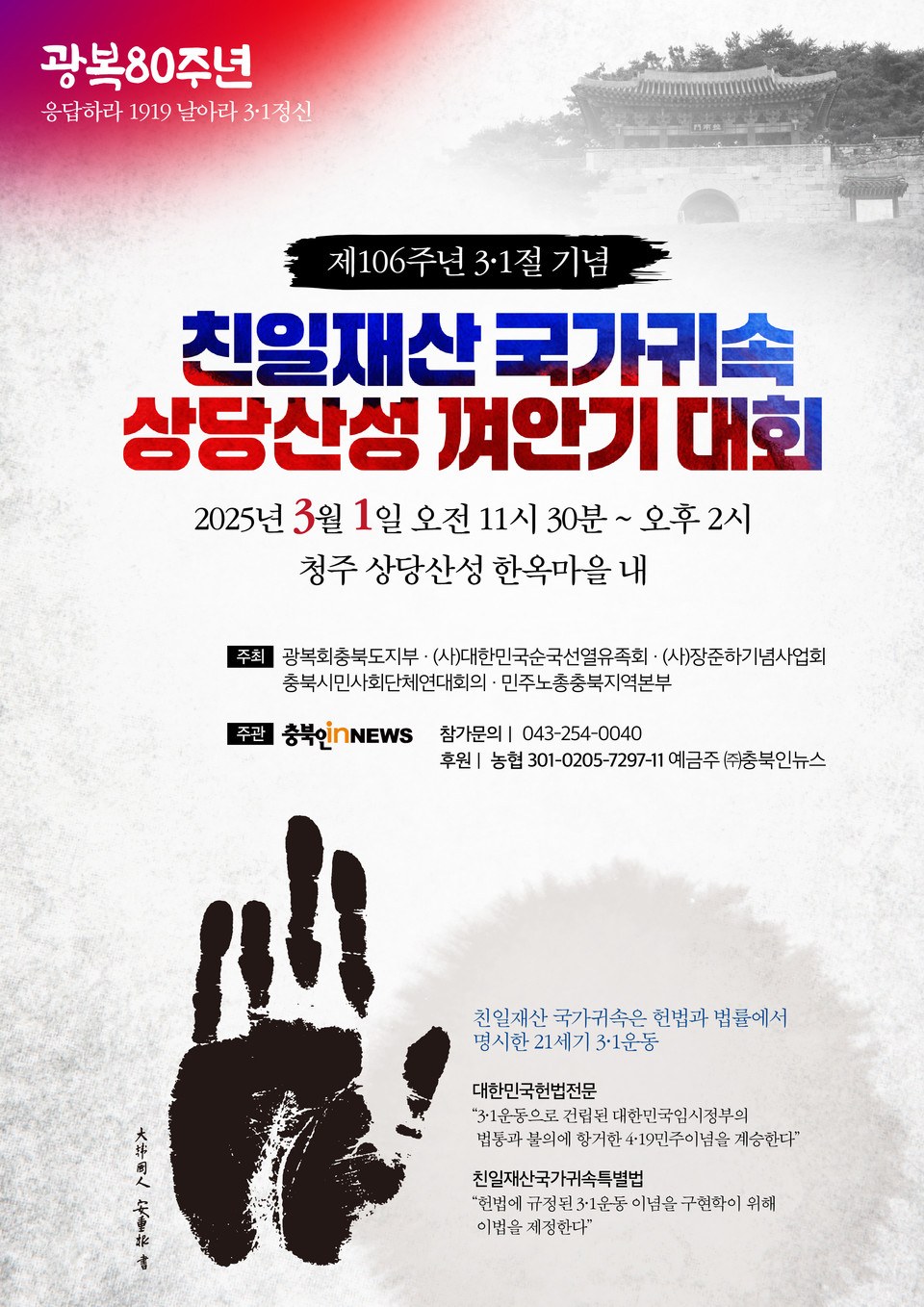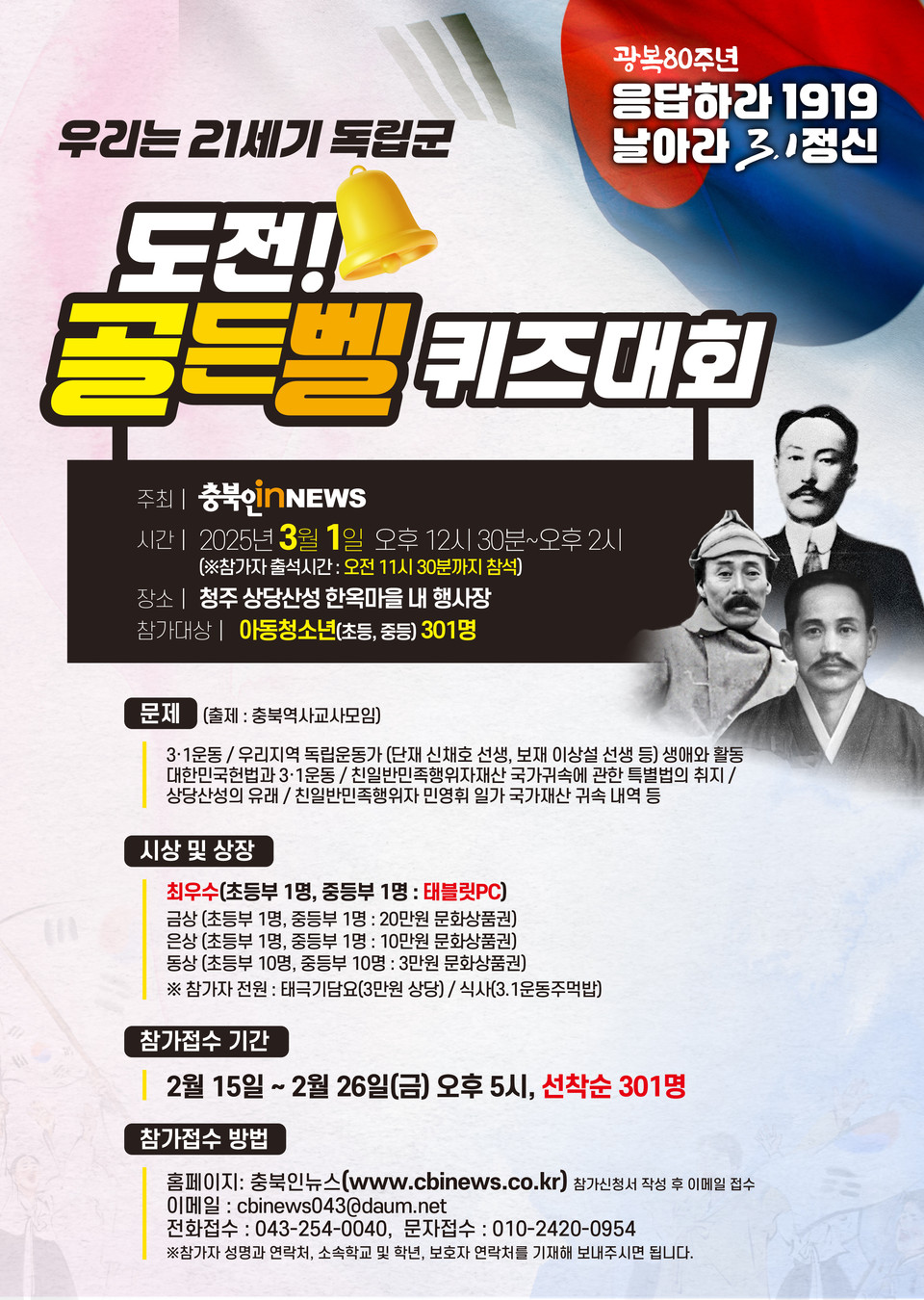유허비는 적막한 수이푼 강가에 쓸쓸하게 남고
끝내 기단 밑으로 쓰러진 중국 미샨시 한흥동 이상설 기념비
사후 97년 만에야 대한민국 국적 회복
묶음기사

역사의 시계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왔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던 1905년 을사늑약. 시간은 120년이 흘러 ‘을씨년 스런’ 을사년이 돌와왔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한국 영토를 벗어나 최초로 무장독립투쟁 기지를 건설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인물이다. 상해임시정부 보다 5년이나 앞섰다.
그의 수많은 업적을 역사적 평가로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설 선생에게 수여한 서훈(2등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격이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그동안 보도한 기사를 보충하고 첨가해 ‘이상설 다시보기’ 기사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혼(魂)인들 어찌 감히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 글을 모두 불태워 강물에 흘려 보내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상설 선생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의 끈을 놓으면서도 ‘조국의 광복’을 염원했다.
“혼(魂)인들 어찌 감히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라던 이상설 선생.
선생이 그토록 원하던 조국의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뤄졌다.
드디어 ‘혼(魂)’이라도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환경이 마련됐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이상설 선생이 ‘무국적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자그마치 돌아가신 지 97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2013년 9월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 2013년 9월 선생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그때까지 이상설 선생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3월13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2005년 당시 김원웅 국회의원 등 38명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조선인으로서 일제 때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본다”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4년 만이다.
그때까지는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적법 개정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상설 선생은 여기서도 제외됐다.
독립운동가 국적 회복 신청은 직계존비속이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는데, 이상설 선생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흘러, 2013년에야 이상설 선생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됐다.
한흥동에 세워졌던 투쟁유지비, 제막식 앞두고 기단밑으로 쓰러져



2017년 3월 송기섭(더불어민주당) 진천군수 등 일원은 중국 헤이룽장성(흑룡강성) 미샨시(밀산시)로 떠났다.
방문 목적은 이상설 선생이 독립운동 근거지로 삼았던 미샨시 한흥동에 대한 성역화 사업과 추모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제적 목적 등 다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역사외교 였던 셈이다.
바로 성과가 나왔다. 미샨시 인민정부와 진천군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해 8월 한흥동에 이상설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기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국 미샨시 인민정부는 6월 기념비를 세울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다.
7월에는 기념비까지 세워져 제막식 행사만 앞둔 상태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졌다. 박근혜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국내에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가 중국 영토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꼬일대로 꼬인 한중관계는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중국 미샨시인민정부는 제막식 행사를 취소하고, 이미 세워졌던 기념비를 기단 밑으로 쓰러뜨렸다.
보재(溥齋) 이상설(李相卨·1870~1917)의 유허비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수이푼 강가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수이푼’강을 ‘슬픈 강’으로 불린다.
유허비 주변은 유난히 적막하다. 주변에 인가조차 없다. 유허비로 가는 도로는 풀로 뒤덮여 있다.
그의 활동무대였던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미샨시 한흥동에 남아있는 이상설 선생의 흔적은 여전히 애처롭다.
해외 무장독립투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이상설 선생.
조국에서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상설 선생이 국적을 회복하는데 사후 97년이나 걸렸고, 수여된 서훈은 1등급도 아닌 2등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