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이 꼭 알아야 할 친일파 3
충북경찰청, 한정석을 충북경찰청의 뿌리라며 누리집에 게재
실상은 독립군 때려잡던 일제 경찰 출신
일본군대 헌금 내기위해 부인에게 떡까지 팔게 해
묶음기사


대한민국은 1919년 출범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출발은 상해임시정부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과 충북지방경찰청은 1945년 점령군으로 들어선 미군정(美 軍政)이 설치한 경무국에서 뿌리를 찾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역대 충북경찰청장’란을 두고 관련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초대 경찰국장 박노태(朴魯泰.1945.9.26.~1945.10.21), 제2대 국장에 한정석(韓定錫. 1945.10.8.~1945.10.21.), 제 3대 국장 김영규(金永奎. 1945.10.21.~1946.3.10.)로 소개하고 있다.
미군정 당시 경찰국장은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대한민국 경찰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의 날 기원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21일 미군정 아래에서 국립경찰이 창설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미군정 아래에서 경찰총수는 미군 헌병사영관 쉬크 준장이었다.
점령군 자격으로 들어온 미군정이 출범시킨 경찰국을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로 삼았다는 것은 현재도 논란의 대상이다.
상해임시정부 경무국 (1919년 8월 출범)을 뿌리로 삼고 경찰의 날도 그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을 제켜 두더라도, 충북경찰청이 사진까지 올리며 소개한 인물들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초대 국장으로 소개한 박노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군수를 지낸 인물이고, 한정석과 김영규 모두 악질적인 친일파로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인물이다.
조선총독부 경찰(한정석, 김영규)출신을 버젓히 대한민국 충북지방경찰청의 뿌리라고 소개하는 셈이다.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악질경찰 한정석
창씨명 오하라 데이샷쿠(大原定錫)인 한정석은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경찰로 지냈다.
이보다 앞서 1908년 대한제국 경시청의 경부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일본군과 맞서 싸운 의병을 수사하는 일이였다.
말만 대한제국 경시청이였지 당시 법원의 재판장도 일본인이였고, 한정석의 상관도 일본인이였다.
그가 수사한 인물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의병 신창룡이다. 신창룡 선생은 1908년 8월 최문봉 선생이 이끄는 의병진에 가담해 그해 12월까지 서울 뚝섬 파출소와 일본인의 집을 습격해 총기 등을 탈취했다. 탈취한 총기등으로 일본인들을 처탈하고 의병자금을 거출하다 결국 체포됐다. 1909년 6월 5일 일본인 재판장 결성조양(結城朝陽)은 한정석이 작성한 조서를 바탕으로 신창룡 선생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열흘 뒤 1909년 6월 16일 교수형이 집행돼 신창룡 선생은 순국했다.
1919년에는 의친왕 이강을 상해로 탈출시켜 임시정부에 참여시키려 했던 ‘조선민족대동단’(이하 대동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대동단은 의친왕을 상해로 탈출시켜 조직의 수령으로 추대한 후 국내에서 3‧1운동과 같은 독립선언운동을 다시 일으킬 작정이었다. 그해 11월 9일 중국 안동현에서 검거됐고 대동단원은 10년부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뤘다.
“일장기 아래에서 죽어라” 일제는 영화만들고 한정석은 충성비 만들고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황민화’의 영웅이 필요했다.
1939년 일제는 청주시 사주면 사창리에 살던 노인 이원하를 영웅의 주인공으로 끌여들었다.
1939년 1월 26일, 당시 74세였던 이 씨는 감기에 노환이 겹쳐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실종됐다.
일제는 사라진 이 씨가 집에서 200미터나 떨어진 국기(=일장기)게양대 밑에서 큰절을 하는 자세로 죽어 있었다고 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이원하가 천황폐하가 사는 동쪽을 향해 엎드려 있었다며 대대적으로 보토했다.
그해 2월 이 씨의 이야기는 소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일왕에 대한 애국심의 전 조선적 모범 인물로 만들었고, 후에 ‘국기 밑에서 나는 죽으리’라는 영화까지 만들었다.
당시 청주시 사주면장이였던 ‘이원하’ 영웅만들기에 앞장섰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정석은 사주면장으로 있으면서 ‘이원하 충성비’를 건립하는데 앞장섰고 일본 국기 밑에서 죽으로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문금 내기위해 부인에게 떡까지 팔게 한 한정석
<경성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정석은 일본군인에게 위문금을 보내기 위해 부인을 시켜 떡까지 팔게했다.
1937년 9월 16일 <경성일보>는 “비상시국에 직면해 조선 부인이 거리로 나와 애국의 적성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주인공은 한정석을 비롯해 청주지역 대표 친일파인 민영은(閔泳殷), 이명구(李命求), 최동선(崔東善), 이희준(李熙俊)이다. 이들 인사들은 일제 전투기 ‘충북호’를 만들라며 거액의 헌금을 냈던 인물이다.
한정석을 비롯한 이들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부인에게 떡 300개를 거리에서 팔게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수익금을 황군(일본군) 위문금으로 헌납했다.
침략전쟁 에도 앞장서
한정석은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청주시 사주면장을 지내면서 전쟁물자를 공출하는데 앞장섰다.
1938년 한정석은 일제가 침략전쟁의 지원하는 후방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국민정신총동원 청주군연맹’ 이사를 맡았다.
한정석은 1938년 8월 24일 청주군연맹 결성식이 청주신사에서 열렸는데, 일본군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일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했다.
1938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를 맡았다.
1941년에는 황국신민으로 황도정신 선양과 사상통일, 전시체제하 근로보국 등의 강령을 내건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에는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올랐다.
이 외에도 충청북도상공경제회 설립위원으로 활동했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40년 가까이 오로지 친일의 한길을 유지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한정석.
그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돼 역사의 단죄를 받는가 싶었다. 공민권정지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한달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리고 8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역사는 그를 다시 대한민국 충북경찰의 뿌리로 화려하게 복권시켜줬다.
2025년 8월30일 대한민국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가 그 근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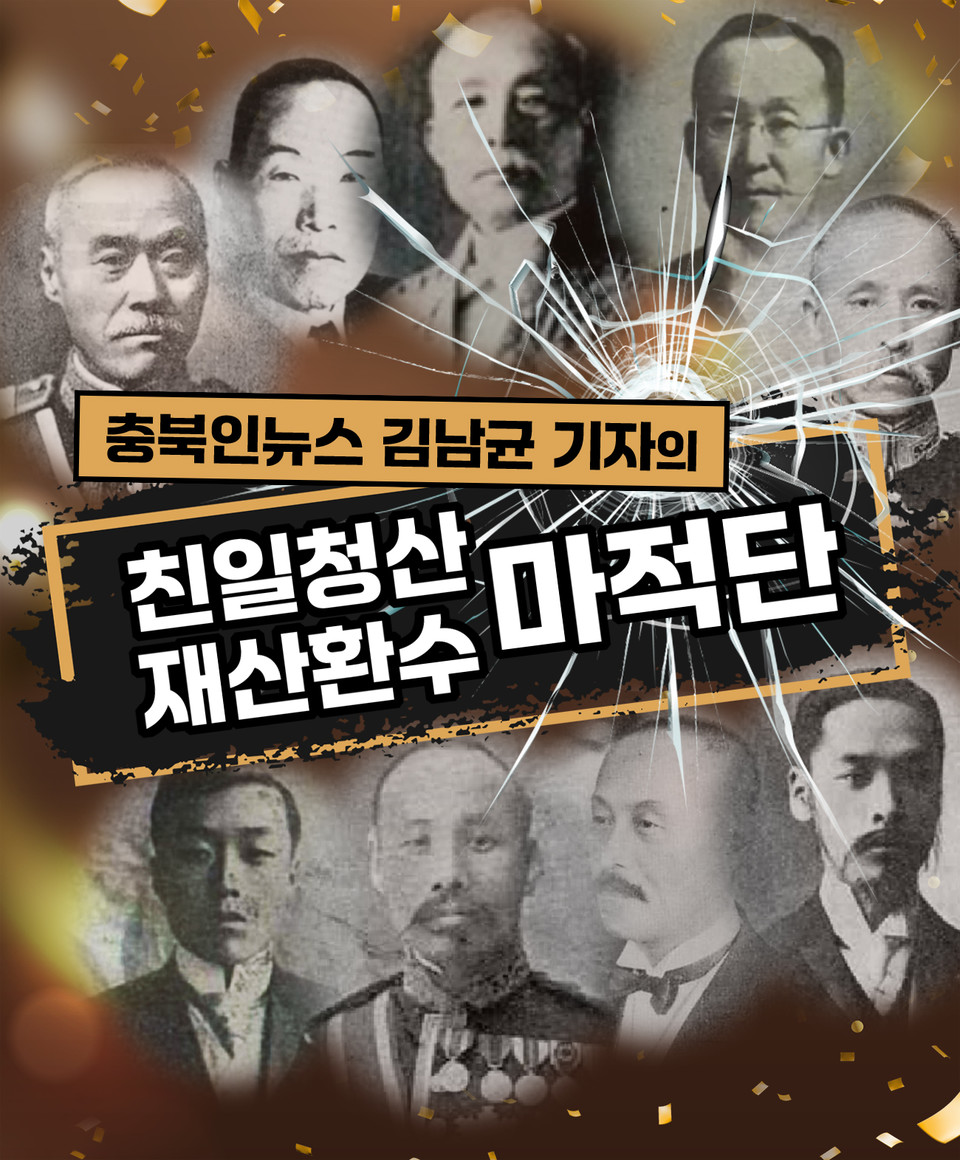
한정석(韓定錫. 1883.3.17.~1953.9.20.)
일본명 : 大原定錫 (오하라 데이샷쿠)
본적 : 충청북도 청주시 대성동 104번지
1908.3. 대한제국 경시청 경부
1910.~1935 조선총동부 경무총감부 동대문분서 경부
1912.8.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1916~1919.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보안과 경부
1920~1921.12.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1921.12~1924.12 조선총독부 충북경찰부 경시
1925~1926. 충북 청주군 가덕면장
1928.11. 일본정부로부터 쇼와대례기념장
1933.6.30. 일본정부로부터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음
1933.6. 일본정부로부터 국세조사기념장을 받음
1936.2 청주상당금융조합장
1937. 재단법인 청주사립상업학교 이사
1937.9~1941.12. 조선총독부 충북 청주군 사주면장
1938.8. 국민정신총동원 청주군연맹 이사.
1939.11. 충북유도연합회 이사
1941.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1942.0. 충북인조진주공업조합 대표. 충북피복공업조합 중역
1943.5. 조선총독부 청주읍회 의원
1943.9.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1944.9. 충북상공경제회 설립위원
1945. 조선총독부 충북도회 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1945.10.8.~10.21 미군정 2대 충북경찰국장
1949.3.29.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
1949.7.7. 공민권 10년 정지 선고
1949.8. 병보석 석방.
1953. 사망(71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