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언론보도 ‘영동에서 시작 청주까지 전파된 듯’
충혼탑 인근 버젓이 복원…충북대 박물관도 인식 오류
특별기고/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지 67주년이 지났지만 식민의 그늘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달려갈 태세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와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으나 정부수립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 일파였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이처럼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친일파는 계속하여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며, 아직도 식민사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착취수단으로 훼손되었거나 악용되었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주시가 농경시대의 산천숭배 유적으로 오인해 기념하고 있는 천지신단(天地神壇) 비석이 그 대표적인 예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소재 충혼탑 입구에 보면 ‘천지신단(사진1)’이라는 석물이 있다. 天地神壇이라 세로로 새겨진 비가 있고, 그 앞은 묘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석이다. 얼핏 보면 농경시대의 산천숭배와 관련한 우리네 전통문화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짝퉁이다. 일제가 1935년에 조성했던 천지신단이 없어진 그 자리에 다시 세운 것이다. 1970년대의 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언제 무슨 까닭으로 다시 세웠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또 다른 천지신단을 찾아보자.
충북대 신단비 사직동에서 온 것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디지털청주문화대전>에 ‘천지신단’을 입력하면,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었던 신당이라 정의하면서 “청주시 용정동 이정골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동제를 지낸다. 동제는 천제당에서 먼저 제사를 올린 후 산제당으로 내려와 산신제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마을 앞에 있는 선돌에 장승제를 지낸다.
제일은 보통 정월 열 나흗날이거나 보름이 택일된다. 낙가산 중턱에 있는 천제단에서 천신제를 지내고, 50m 내려와 위치한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낸 후 마을로 내려와 다시 천지신단에 장승제를 올릴 준비를 한다. 천지신단은 마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장승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천지신단이라 적혀 있는 돌이 장승제를 지내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천지신단이라 부르지 않고 장승이라고 부른다. (중략) 1990년대까지는 용정동 중고개에 있었던 천지신단에서 장승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없어졌다(사진3).”라고 설명돼 있다.

‘천지신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충북대 야외박물관의 천지신단이나 용정동(이정골)에 있었던 천지신단은 전통시대의 신앙과 관련된 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사직동 토박이 주민들은 러일전쟁 전몰 일본군 추모비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잘못은 현재 충혼탑(청주시 사직동) 자리가 본래 사직단이었는데, 일제가 사직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일·러일전쟁 전몰 일본군 추모단을 세웠던 데서 연유한다. 일본군 추모비와 천지신단은 서로 다른 것인데 위치가 인접해서 빚어진 오해로 생각된다. 심한 경우 천지신단을 사직단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까지 있다.
천지신단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런 저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일까. 천지신단은 일제가 식민지 수탈의 한 방편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강민식 박사는 “부산일보 소화 10년(1935년) 7월31일 자에는 구체적으로 신단 건립의 목적 및 제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비석이?충북대학교에 있는 천지신단 비석”이라면서, 영동군의 천지신단 조성사례가 소개된 관련 논문을 근거로 “일제는 천지신단을 중심으로 촌락민의 신앙심을 유도하여 민심을 통제하면서 화합, 내선인의 융화협조, 농민정신의 작흥 훈련, 생산개량증산 등을 달성코자”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 당시 기사에 등장

천지신단이 일제강점기에 소위 농촌진흥운동이라면서 식민지 조선의 농촌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여 수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임은 당시의 ‘동아일보’ 등 일간지나 ‘자력갱생휘보’ 등 신문 잡지를 통해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고, 아오노 마사아키의 논문’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농촌진흥운동기의 경신숭조(敬神崇祖)’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은 농산어촌의 ‘자력갱생’을 슬로건으로 세운 정책으로 1932년 9월에 조선총독부에 위원회가 설치된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는데, ‘갱생지도부락’을 선정하고 그 ‘부락’의 각 농가마다 ‘영농개선’과 ‘생활개선’을 위한 농가갱생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통해서 행정력이 침투되거나 ‘황국농민’이나 ‘경신숭조’ 등 정신적으로 유사일본적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1935년의 ‘국체명징성명’에 따라 ‘심전개발’정책으로서 국체관념, 경신숭조를 내걸고 있다. 조상을 숭배하는 조선인의 정서에 기대어 ‘조상숭배’가 ‘황실숭배’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천황귀일’ 사상=’황국의 농민’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관제 촌락제사의 사례로서 영동군 영동면(면장 홍명희) 면내의 촌락에 ‘천지신단’이라는 소사(小祠)를 만들어, 거기에 ‘천지대신’을 모시고 ‘부락사(部落社)’로 하고 있다면서, 자력갱생휘보 제9호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영동면 회동리 이장 장영철과 일본인 스미야 카메조 두 사람은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932년 8월 천지신단을 설치하여 벚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키우며 청소, 참배, 부락의 모임 그리고 춘추 두 차례 제사를 올리는 등 신단을 성역화 하면서 계발지도에 여념이 없는데, 조선재래의 요소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동의 천지신단은 농촌지도에 아주 적절하다고 절찬하고 있다.
청주발 부산일보의 천지신단 기사 내용이 영동의 천지신단과 거의 동일한 것은 소위 농촌진흥운동이 본격 추진되면서 영동의 자생적 사례를 청주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 정체 알리고 짝퉁 철거해야
현재 사직2동 충혼탑 입구에 설치돼 있는 천지신단을 두고 2009년 4월 한 지방신문은 “천지신단비는 日 전몰자 추모비”라 잘못 기사화 된 일이 있고, 최근에도 잘못 알려진 얘기가 채록되어 웹에, 그리고 또 다른 일간지에 전재되기도 했다.
사직2동에서 예술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화가 이종현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주민 자서전 만들기-토박이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구전 중에는 “러일전쟁 때 죽은 일제 장병의 위패를 모은 신단이라는 설이 유력하다”며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고 있다.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적은 알림판을 설치하는 것이다.”라는 토박이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지방신문이나 웹 기사의 오류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한 것이고, 이런 잘못은 일제 때 ‘추모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는 청주의 사직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청일, 러일전쟁 때 전몰한 일본 군인을 위한 추모단을 만들었다. 오늘날 사직동 충혼탑 자리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근에 설치한 천지신단을 추모비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충북대 당국에 바란다. 청주시는 사직동 충혼탑 입구에 설치한 천지신단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충북대는 1935년 조성한 천지신단 설명문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충혼탑 옮기고 사직단 복원하라
문제는 또 있다. 조선시대 사직단을 없애고 일제가 설치했던 추모단 자리에 해방 후에는 우리의 충혼탑을 세웠다. 그런데 이곳은 본래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던 곳이다. 사직동이란 지명의 유래가 바로 이 사직단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국가를 뜻하는 ‘종묘사직(宗廟社稷)’이라고 할 때의 사직인 것이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제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사당이고,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왕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지방에 설치했던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일제식민지 정책에 의해 수탈의 방편으로 조성했던 천지신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잘못된 기록물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2차, 3차 자료가 확대 재생산되는 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일제가 저들의 전몰장병을 위해 조성했던 추모단 자리에 우리의 ‘호국영령’을 위한 충혼탑을 건립하고 기리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인가. 본래의 사직단을 복원하고 충혼탑은 다른 길지를 택해 새로이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마침 청주·청원 통합이 결정된 마당에 좀 더 넓고 트인 공간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농민의 정신통일 “천지신단” 건설계획
물심양면으로 지도 농촌진흥의 결실을 올리다.
부산일보 1935년 기사와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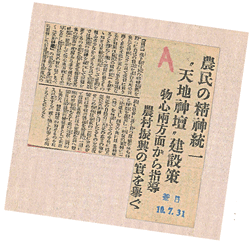
건설 장소는 부락민이 가장 많이 집결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지점을 선정하여 1평의 면적에 2-3척을 쌓아올려 사방에 상록수(소나무)를 심고, 중앙에는 그 부근의 자연석으로 3척 높이의 물건을 정하여 천지신이라고 적은 것을 안치한다. 祭典은 봄, 가을 2번 정하여, 春祭에는 농작물의 풍작을 부락민 모두 기원하여, 秋祭에는 추수한 농작물을 차려놓고 풍작의 봉고제(신에게 아뢰는 예식)를 하여 다음 춘추 2번의 祭日은 부락민의 즐거운 날(오락일)로 활용하여 씨름, 풍년춤 등과 같은 것을 도입하여 요컨대 충분히 즐기게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