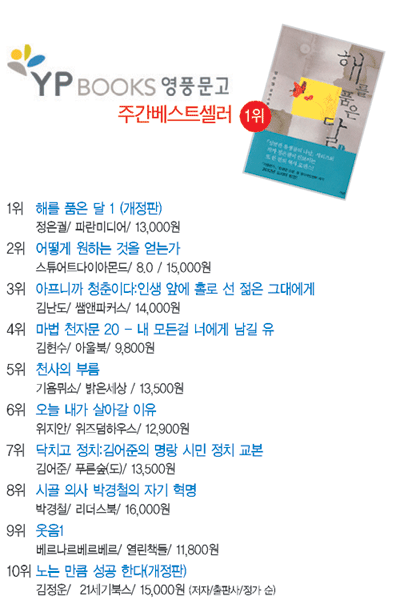장-뤽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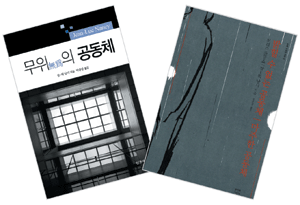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다소 지긋지긋하고 짜증도 나지만 그저 좋은 것만 보고 뭐 되는 대로 끝까지 함께 가자,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뒤돌아서기 몇 회, 친구 등에 칼 찌르기 몇 번, 그러다 후회하고서는(정말은 아니지만) 다시 앞으로 가 눈물 흘리며(악어의 눈물!) 화해하고(거짓 화해)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서로 부둥켜 안고(누가 먼저 손 떼는가를 계산하면서) 또 오늘을 산다. 내일 다시 내가 칼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찌를 수도 있고 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는 실은 누더기 같은 것, 참 구질구질해서 버리고 싶은데 쉬 버릴 수도 없는 계륵(鷄肋) 같은 그 무엇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공동체는 불의(不義)에도 눈감을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어머니 품 같은 안락한 소파일 수 있다.
오늘의 벗이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벗이 될 수 있는 무형의 시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찬양할 수도 있다. 오, 선과 악을 쉬 넘나들게 하는 우리 공동체여, 영원하라! 찬송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이 글을 끼적이고 있는 ‘나’는 매일 ‘내 자신’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지쳐 잠들 때에야 비로소 ‘나’에 대하여 눈곱만한 믿음을 발견하곤 한다.
그러므로 필자에게 공동체라는 단어는 너무 크다. 그 안에는 무수한 당신이 있고, 그러므로 무수한 내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좀처럼 감당하기 힘든, 도무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안에서 편할래야 편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도 애써 자꾸 공동체를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당신들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말을 나는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때 내 자신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나는 당신 자체를 온전히 사랑할 자신이 없다. 그저 나는 당신의 어떤 부분, 나와 당신이 만난 어느 자리, 참으로 행복하게 만났던 어느 순간을 사랑할 뿐이다. 소망하건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자주 있기를, 어쩌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건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누어 당신의 팔 또는 다리 한쪽, 당신의 머리 한 켠을 나에게 주고 나 또한 기꺼이 당신에게 나의 심장, 나의 눈 하나, 나의 노래 한 소절을 주는 그런 만남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에 있고, ‘공동-내-존재’로서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건대 이미 나는 내가 아니면서 나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이 아니면서 당신이다. 나를 부정할 수 있고 또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그리고 그대도 그러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결국 바다 건너 저 멀리 프랑스라는 나라의 철학자 장-뤽 낭시가 말하는, ‘무위의 공동체’란 그런 것 아니겠는가.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를 건네받은 모리스 블랑쇼가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서 말하는 바도 그와 같다. 모든 집착을 버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놓을 수 있는 능력, 그 혁명적 수동성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의 맥락과는 심히 달라 독해가 까다롭긴 하지만 결국 그런 것 아닐까.
“따라서 공동체라는 단일체도 그 실체도 없다. 왜냐하면 그 분유(分有, 나눔)가, 그 이행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완성이 그 ‘원리’이다. 미완성을 불충분성이나 결핍이 아니라, 분유(나눔)의 역동성을, 또는 단수적 균열들(‘나’라는 온전한 개인을 만남의 정황에 의해 낱낱이 나누는 것)에 따라 끊이지 않는 이행의 역학(당신과 내가 넘나들며 옮겨가는 것)을 가리키는 역동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분유(나눔)의 역동성, 다시 말해 무위의 역동성, 무위로 이끄는 역동성.”(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내 자신을 온전하게 완결된 하나로 생각하는 ‘주체적 개인’이라는 관념의 해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애쓰고 실행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한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그런 행복한 만남이 나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자주 실현되기를 원한다.
신간소개

1만3000원/ 나채훈/ 북오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기에는 조금 늦은, <은퇴 후의 80,000시간>을 읽기에는 조금 이른 어정쩡한 나이가 마흔이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부하직원에게는 회식자리에서 빠져주기를 바라는 노땅일 뿐이고, 경영진회의에 참석하기에는 아직 이른 사람이다. 앞장을 설 수도 뒷전으로 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 속에서 본받을 만한 인물을 찾자면 단연 사마의다.

1만1000원/ 황정은/ 창비
2010년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큰 주목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설가 황정은의 두번째 소설집. 폭력적인 세계를 간신히 살아내는 인물들을 감싸안는 소설적 윤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소설은 정황에 대한 구구한 설명 없이 간결한 행동 묘사와 생생한 대화만으로, 어쩌면 특별할 것도 없는 사건을 낯설고 강한 여운을 남기는 한 편의 부조리극으로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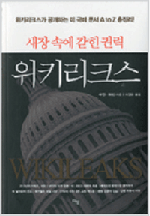
1만3800원/ 쑤옌,허빈/ 다상
누가 미국에게 세계를 지배할 권리를 주었나?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다른 나라를 조종하고 침략해도 비난받지 않을 권리를! 이 책은 홍콩의 유명 일간지 베테랑 기자인 쑤옌蘇言과 허빈賀瀕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건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폭로 문건을 다루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세기와 현 세기를 살아오면서 보아온 질풍노도와 같은 사건들의 중심에 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