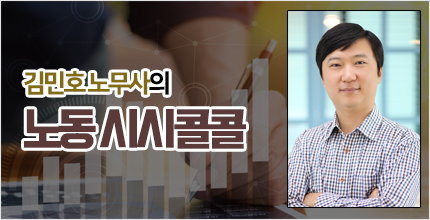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민법>상 급료채권의 단기소멸시효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직노동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3년 동안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경과)되어 더 이상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한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15일째 되는 날부터 5년입니다. 월급, 상여금 등과 달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그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청산)해야 하는 기한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3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그 다음날인 ‘15일째 되는 날(공소시효의 기산일)’부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14일 동안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를 유예해 준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등)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인정(승인)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소멸시효가 중단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청구의 방법은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한 직접 청구(단,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필요), 소송 제기ㆍ가압류ㆍ가처분ㆍ압류 등 재판상 청구가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종료(판결 확정일, 승인일 등)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