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노래> ⑤

작곡가 김성태씨는 <이별의 노래> 작곡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부산에서 대구의 박목월 시인을 만나러 갔다. 학(鶴)과 같은 박 시인의 모습이 보고싶어졌다.
여름이었다. 박 시인은 “기다리고 있었소.”하고 그를 반가이 맞았다. 박 시인은 전할 것이 있다고 했다.
<이별의 노래>였다.
예술은 감동이다. 김성태씨는 “그 시를 읽고 무척 감동했습니다”하고 그때의 감동을 되새겼다. 그는 그날 밤 곧 작곡에 착수했다.
그런데 희맑고 쓸쓸한 이 아름다운 가곡은 몹시 산문적(散文的)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분지인 대구의 더위는 살인적이다. 그는 여관방 모기장에 드러누워 떠오르는 악상(樂想)을 다듬어 갔다. 
20년전 한 밤을 샌 여관방 모기장 빛깔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이별의 노래>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이 가곡의 작곡 과정은 그의 정신세계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것이다.
박목월씨는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김성태씨와 헤어졌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에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오버랩 되어 이 시가 만들어졌죠”라고 시가 쓰여진 동기를 이야기 한다.
이런 배경 아래 작곡된 <이별의 노래>가 처음 연주, 발표된 곳은 부산이다. 김씨가 지휘하던 해군 군악대와 대학생들로 만들어진 합창단이 이 가곡을 연주, 합창했다.
그 시대 감정을 표상하는 것 같아선지 이 가곡은 금방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었다. <봉선화에서 무덤까지> (지철민, 심상곤 공저·무궁화사 1973)
김성태 작곡집(도서출판 예음·1991)에는 물론 다른 음악관련 자료들에도 <이별의 노래>의 작곡 연도는 모두 1952년으로 나와있다. 그러니까 <이별의 노래>가 작곡된 것은 1952년 여름, 시가 쓰여진 것은 그 이전이 된다. 이향숙씨의 추측보다 조금 더 앞당겨져야 하는 것이다.
부산의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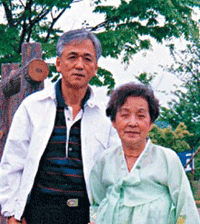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사랑했었다. 절망을 발에 밟고 사는 생활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절박한 것이 그녀와의 인연을 맺게 한 것일까.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이 불현듯 바다 가득히 퍼졌다. (중략) 그녀는 항상 내 속에 살고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녀와 함께 나는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수동(寶水洞)으로 접어드는 골목길에서 나는 당황했다.” <구름에 달 가듯이>, (삼중당, 1973)
혹시 <이별의 노래>에서 읊은 여인이 이 여인은 아닐까? 어쨌든 <빈 손바닥>이란 제목의 시는 이 여인을 떠올리며 지은 시가 분명하다.
보수동(寶水洞)이란 거리가 있었다.
부산에는 보수동이라는
거리가 있었다.
(중략)
이 세상에서는 누구라고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여인과 나는
그 거리의 상반(床飯)집에 드나들며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냈다.
세상에서는 그녀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그것은 신(神)의 뜻이므로
그녀와 보수동이란 거리를
가슴에 묻어 두었다.
(후략)
<현대시학> 1971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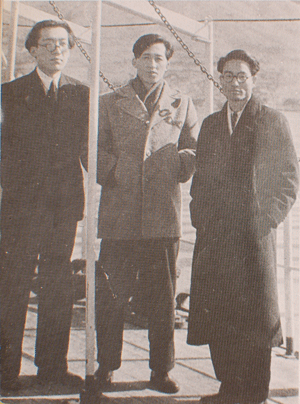
위의 글과 시와 연결될 듯한 또다른 목월의 글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별의 노래>에 대해 목월 자신이 쓴 글(4편 참조)과도 어느 맥락에선가 이어질 것 같은 이야기다.
“6.25사변 때의 극렬한 죽음의 시간 위에 아로새긴 나의 사랑, 절망의 막다른 시간 속에 밤마다 나타난 인어 공주,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죽음의 시간 속에서 획득한 생명의 찬란한 광채요, 장엄한 낙조(落照)다. 그러나 그것은 눈물 젖은 내 볼 위에서 승천해 버렸다.”
<밤에 쓴 인생론> 중 ‘목마른 역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목월이 60세 가까이 되어 쓴 <왕십리(往十里)>란 제목의 이런 흥미로운 시도 있다.
내일 모래가 육십(六十)인데
나는 너무 무겁다
나는 너무 느리다.
나는 외도(外道)가 지나쳤다.
가도
가도
바람이 입을 막는 왕십리.
원본 논란
<이별의 노래> 원본이라고 일부에서 알려진 시가 있다. 6연 24행의 긴 시다. 목월의 <이별의 노래>는 이 시를 노랫말로 줄인 것이라는 거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고 끝난다.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리
높은 하늘 싸늘한 바람 먼 나라
그렇게 높이 우리 가슴은 그리움을 키웠는데
이제 깊게 빈손으로 돌아가라 하네요
(중략)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 깊어 가겠네요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우는 겨울밤도 있겠지요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야속한 가을날이
그래도 아름다운 건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월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은 목월이 쓴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원본시가 아니라 <이별의 노래>를 가지고 후에 누군가가 이런 저런 살을 붙인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도 분명한 출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목월 시집에 없는 <이별의 노래>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목월의 <이별의 노래>는 목월의 시집에 없다. 필자의 탐색이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별의 노래>는 청록파 3인이 쓴 청록집(靑鹿集·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3인 시집·을유문화사 1946)에도 없고, 목월의 첫 번째 개인 시집 산도화(山挑花·영웅출판사 1955)에도 없고, 그 후 어디에도 없다. 앞서 말한 대로 <구름에 달 가듯이>란 제목의 목월의 산문집 속에 실려있을 뿐이다.
가곡 <이별의 노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별의 노래>에서 <떠나가는 배>로 이어지는 슬프고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누군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 낸 새로운 창작물임이 이제 거의 분명해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 쓰여졌던 누구를 대상으로 썼건 무슨 상관이랴. 그 시와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은 모두가 그러한 상황과 그같은 심정에 공감하기 때문 아닌가?
사랑하던 이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시(詩)속에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던 박목월도 어느날 그들처럼 저 하늘로 갔다.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했던 것처럼.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것’, 그것은 그리움과 슬픔의 끝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