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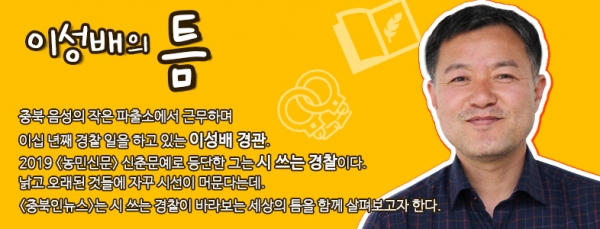
지난여름의 일이다. 기습폭우가 내리는가 싶더니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단독주택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은색 금속 배수관은 된통 사레가 걸린 것처럼 쿨럭이며 옥상의 빗물을 마당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골목은 벌써 개울이 되어 제법 빠른 물살이 골목을 쓸고 다녔다. 낭패였다.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는 소리에 아이가 쌩이질을 치듯 미용실을 돌아온 물살은 야트막한 경사를 타고 모퉁이 집인 우리 집 쪽으로 와서 부딪혔다.
이대로 있다가는 물살이 경계석을 넘어 마당으로 넘칠 게 뻔했다. 오래돼서 좁고 얕은 골목 양쪽의 배수구는 낙엽으로 막혀 제대로 빗물이 빠지지 않았다. 나는 장대비를 맞으며 낙엽을 걷어내고 상가 주인이 냄새를 막으려고 덮어둔 장판 조각들을 걷어내며 골목으로 넘치는 빗물의 양을 줄여보려 애를 썼다. 그만하면 가상하다는 듯 장대비가 잦아들기 시작해 겨우 침수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떠올려도 당황스러운 기억이다.
근처에 사는 아버지가 아내에게서 아들 집의 위기 상황을 전해 듣고 돌아간 며칠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얘, 내가 담장 밑에 틈 있잖어? 그거 내가 모조리 틀어막았다. 그런 줄 알어.” 목수 일을 했던 아버지는 경계석과 우리 집 나무 울타리의 한 뼘 정도 되는 틈새를 두툼한 스티로폼으로 솜씨 좋게 잘라 막아두었다.
흰 양말에 검정 구두를 신은 것처럼 나무 울타리 밑부분을 희뿌연 스티로폼 조각으로 돌려 둔 것이 그리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었지만 빗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에는 믿음직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모조리”라는 말에 자꾸 여운이 남았다. 일석이조, 아버지는 빗물의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수시로 담 밑으로 드나들며 화단에 배설물을 싸놓는 길고양이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빈틈없는 대비책을 바라보고 얼마나 흰 웃음을 웃으셨을까.
어느 날 내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타닥 소리와 함께 길고양이가 골목에서 담 위로 뛰어올랐다. 놀라라. 허공으로 틈을 내다니. 혈압약을 드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빗물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방책이 효과가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가난한 시절 흙벽에 틈이 생기면 수시로 덧발랐던 아버지에게 틈은 메꾸고 막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빗물을 두고 아들은 틈을 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아버지는 틈을 막아 해결하려고 했던 셈이다.
사실 틈에 대한 사회 역사적 함의는 간단치 않다. 수시로 개최되었던 궐기대회나 웅변대회의 열기를 기억하는 세대는 한 치의 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불온한 도덕과 맞물려 틈에 대한 불안한 정서가 강할 것이다. 틈 자체는 상황에 따라 막거나 더 벌리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틈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가. 틈이 생길 때마다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다양한 기제의 배후가 몹시 궁금하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붉고 격렬하고 당연시되던 구호가 사라진 이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틈을 내는 기제는 아주 교묘하고 음흉해졌다는 생각이다. 정치인들이 아낌없이 배설하는 ‘국민’이라는 말처럼 언론은 ‘알 권리’라는 견갑(堅甲)으로 무장한 채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알렸는지 묻고 싶다.
게임 점수처럼 매일 속보처럼 띄우는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가 공항 한쪽에 수북하게 쌓인 모습. 우리 교민에 대한 이송의 절박함과 안전한 방역 대책을 보도하는 것보다 임시 거주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주민의 반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던 언론의 모습은 못내 아쉽다.
교민들을 품에 안은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경우처럼 틈은 좁은 내부에서 더 넓은 바깥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하게 틈을 확인하는 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요긴한 동작을 이어가는 일. 이러한 성숙한 반응을 방해하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을 한결같이 사랑한다면서도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안녕하신가. 결국, 틈에 반응하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채색될 것이다. 여러분은 틈을 조금 더 낼 것인가? 아니면 틈을 막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