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작가 야누슈 코르착이 주는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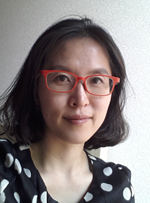
어린이도서연구회 청주지회장
UN아동권리협약의 기반이 된 사상은 1942년 독일의 유태인 말살정책으로 죄도 없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자신이 보살피던 200명 남짓의 고아들의 손을 잡고 죽음의 길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야누슈 코르착의 정신이었다.
폴란드의 의사이자 작가, 교육자, 철학자로 5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참신하고 진실한 실천가로서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고 할 만하다.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은 야누슈 코르착의 글을 모아놓은 것으로 한때 아이였던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며 생각해볼만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어른이 되기만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허겁지겁 어른이 된 이후 기대한대로 꿈을 이루는 어른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어린시절 꾸었던 꿈이라는 것도 정작 나의 꿈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난 나의 어린시절은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고, 정작 어른이 되어서는 꿈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어른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겠구나”라고 말할뿐 ‘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이니?’ 라고 묻지 않는다. 자그마한 손에 연필을 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어린아이는 이미 오늘의 화가인데 더 자라서 미래의 화가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이라는 코르착의 말을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3kg정도 남짓의 갓난 생명을 보살피며 키워온 지난 10여년은 나 자신에게 변화무쌍한 시간이었다. 아이로 인해 내안에서 널뛰는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의 기복을 확인했고, 한 번도 스스로를 강자라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는 자그마한 아이 앞에서 강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비겁한 어른일 때도 있었다. 인형의 팔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매달고 화려하게 인형을 다루는 인형술사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런 인형이라며 아이를 그림같이 키우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어린이는 이미 한 인간이다”
야누스 코르착은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인간이다”라며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아이들의 언어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감성언어와 몸짓으로 아주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눈빛을 마주치며 교감을 할 때 신명이나고 자기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야기들이 춤을 추듯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코르착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한 상처투성이인 고아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중과 사랑을 마음속에 키울수 있는 교육을 실천한 사람이다.
자신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경험이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 것이다.
야누스 코르착의 글 중 “신이시여, 아이들을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글귀가 있다. 처음 이 글귀를 접했을 때 나는 야누스 코르착이 신을 향해 말하는 기도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당당히 서서 구름 너머로 열망의 시선을 던지며 하는 이 말은 신을 향한 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른들에게 그가 조용하지만 굳은 의지를 담아 던지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아름다운 길로의 인도는 멀리 있는 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의 몫일 것이다. 나 역시 오래된 한 그루의 나무처럼 꿋꿋하게 서서 가지를 찾아드는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