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덕 현 총괄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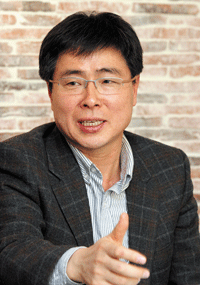 | ||
자세한 전후과정은 알 수 없었고, 다만 주지사는 마주앉은 두세명이 새로 개발했다는 마늘 보존 방법을 설명하자 느닷없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같이 들을 것을 제안했다. 당시 지역의 특산품인 단양 6쪽마늘은 수확 후 일찍 상하는 바람에 그 보존 문제가 일종의 화급한 과제가 됐었다.
얼마 후엔, 주지사가 아끼던 비서실의 모 직원과 관련해 청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를 보다 못해 기자단 대표가 지사실을 방문해 여론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랬더니 주지사, 이번엔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신경써 준다니…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확답하면서 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며칠후 단행된 인사에서 문제의 직원은 별탈없이(?) 자리를 지켰고 기자단에서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주병덕 전지사의 슬로건은 ‘힘있는 충북’이었다. 투박하면서도 소신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과 잘 어울려 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초적인 폄하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 세련된 멋은 없지만 힘있는 충북이 시사하는 우직한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이다.
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가 붕괴됐을 때 한 걱정으로 청주를 찾은 외지 취재기자들은 오히려 호시절을 보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자들이 묵는 숙소에 속옷과 양말이 알아서 배달되는 등 각종 편의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제공됐기 때문이다.
이 일을 당시 이원종지사가 지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지사는 이때 외지 기자들이 가졌던 호감 때문에 얼마후 예상을 깬 서울시장 발탁 때도 여론상의 큰 걸림돌이 없었다. 이러한 정제된 처신은 그가 2002년 자민련을 탈당, 한나라당으로 가기 위한 최종 결단에 앞서 지역의 여론리더층을 일일이 만나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할 때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번은 충북 충남 대전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슨 간담회인가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연 좌중을 압도한 것은 이원종 지사였다. 워낙 달변인데다 실력까지 겸비한 터라 그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때문에 당시 이를 지켜본 충북 취재기자들은 대전 충남쪽 기자들을 의식하며 어깨에 힘을 줬다.
이원종지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으뜸 충북’이었다. 빈틈없는 세련된 매너 때문에 사람사귐이나 현안 접근이 깊지 못하다는 일부비판도 받았지만 그의 절제된 도정운영은 으뜸 충북이라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부양시켰고, 이에 힘입어 지금까지 성공한 도지사로 각인되고 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들은 그를 뽑아 준 유권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각종 여론의 중심에 선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그 구체적 실체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취임1년 쯤이다.
이 때는 당사자들 스스로도 필히 활동의 조정기를 겪게 된다. 다행히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 남은 임기 내내 비교적 블루 오션의 항해를 지속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는 취임 1년만에 덜컥 탄핵에 휘말린 노무현대통령이 줄곧 여론에 시달린 이유이기도 하다.
민선4기 출범 1년이 다가오면서 정우택지사에 대한 평가도 점점 구체성을 띠는 조짐이다.그 중심엔 하이닉스와 복지여성국장 문제가 늘 거론되고 회자되고 있다. 경제특별도건설에 의한 ‘잘사는 충북’을 본인의 아젠다로 정한 정지사가 과연 퇴임후에 어떤 이미지로 남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덕현 기자
doradora@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