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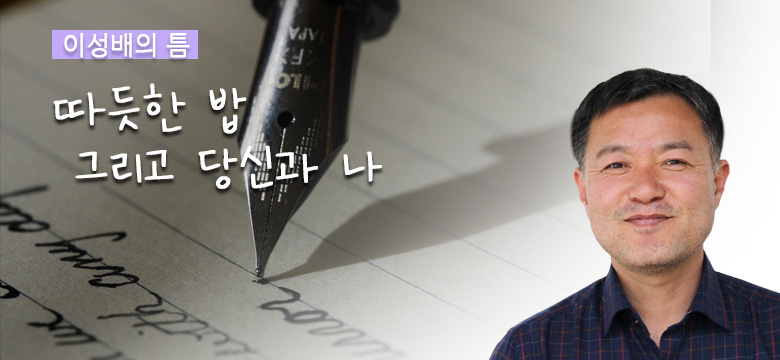
자욱한 안개가 마당 뜨락까지 올라앉은 가을 이른 아침. 부엌 가마솥에서는 배추를 듬뿍 넣은 토란국이 끓고 있었다. 아이는 벼 베기 품을 얻은 마을의 집을 돌며 “우리 아부지가 식사하러 오시래유.”라며 분주한 아침의 일손을 보탰다. 아이도 어른들 옆에서 윤기가 흐르는 따듯한 쌀밥과 계란찜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참 따듯하고 뿌듯하고 배부르던 기억.
벼가 가마솥의 누룽지처럼 잘 여물었을 때 마을의 집들은 벼 베는 날을 잡고 서로 품을 얻어 가을걷이를 했다. 오랜만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해서 벼 베는 날은 아이들에게도 설레는 날이었다.
마을 앞의 논배미들은 사람이 낫으로 일일이 벼를 베야 했기 때문에 가을 산을 비추던 햇살이 천천히 노을을 지으며 질 때처럼 꽤 오래 풍요로웠다. 하지만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는 요즘에는 뭉근하게 스미는 설렘도 없이 순식간에 벼 베기가 끝나고 들판은 허허롭다.
효율성이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사람이 노동과 수확의 기쁨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 그 소외를 상쇄하고 여전히 탄력 있고 윤기 흐르는 삶을 유지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린 너무 외롭다.
효율성 면에서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그 과정이다. 새로 장만해 드린 스마트 폰 때문에 오히려 골치가 아프다는 늙은 어머니의 푸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물건은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생 때 안개꽃이 동봉된 손편지를 받아 본 기억이 있다. 그 당시 꽃집을 가본 적이 없는 촌놈이었으니 앙증맞은 그 꽃이 개망초꽃인 줄 알았다. 답장에 “네가 보내 준 개망초꽃이 밤새 내 마음을 환하게 해 주었어.”라고 썼으면 어쩔뻔했는가. 손편지를 주고받던 기억은 벼 베는 날 아침처럼 설레고 자욱한 안개처럼 신비롭기까지 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대상을 오래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갈하게 가라앉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생각을 편지지에 옮기는 과정도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노랫말을 찾아보고 명언집을 찾아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답장이 도착했으리라는 기대만으로 주변 풍경은 얼마나 빛이 났는지.
손으로 벼를 베는 과정이나 편지를 쓰는 과정은 단순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절차의 의미도 있겠으나 그 과정 내내 지붕 위에 올려둔 술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함께 부풀어 가난해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시간을 스마트 폰에 할애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SNS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하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지 의문이다. 쉽고 빠른 것의 역리 현상은 더 쉽고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하고 허허롭게 만드는 일인 듯하다.
지치고 힘든 요즘. 식구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따듯한 밥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 점점 나이가 드니 생각도 점점 단출해진다. 삶은 불빛의 배경처럼 어둡게 어룽거리는 모호한 그 무엇이 아니라는 생각. 갓 지은 밥처럼 향기롭고 따듯하고, 손편지의 글귀처럼 더 좋은 감정이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감정의 상태가 되는. 이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 또는 그 노력의 연속이 결국 우리 삶이라는 생각.
눈이 내려도 좋을 것이다. 따듯한 밥 한 공기와 손편지 한 장을 지친 당신에게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