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치열하게, 그리고 기꺼이 수치심을 맞이해야 한다
묶음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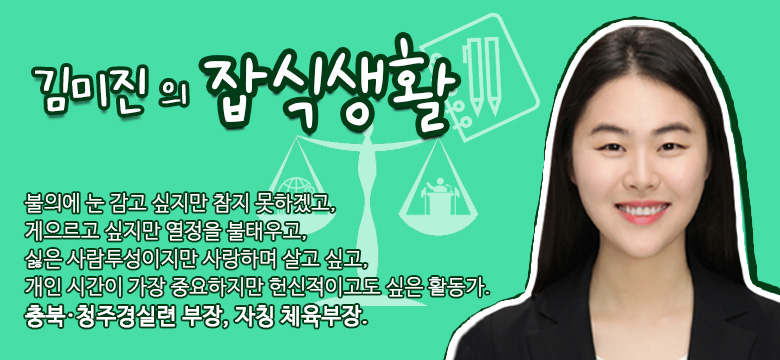
구(舊)애인에게 질척거렸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떠올린 적이 있던가. 초면인 사람 앞에서 주접 블루스를 떨고 있는 오늘의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얼굴색을 활화산에서 갓 나온 용암처럼 뻘겋게 하고선 있는 대로 콧김, 귓김을 뿜어내며 펄펄 뛰고 있는 내 모습까지...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자신의 찌질함을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들킨 순간,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불킥'뿐이다.
힘껏 이불을 발로 차며 수치심을 날려보자. 하지만 미세먼지와 진드기가 풀풀 날리도록 뻥 차 버려도 그 수치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 선생을 떠올려보자. 그 훌륭한 분조차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셨다고 그렇게 합리화해보자. 그렇지만 '침실'이라는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수면'이라 지칭하는 영혼을 발가벗겨 산림욕을 시키는 시간이 되면, 나는 무방비 상태로 어느샌가 적나라하게 내 일상 내면을 맞닥뜨려 켜켜이 쌓인 일상 속 왜곡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거짓에 대한 결벽성을 가진 인생이란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는 저서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의식 레벨을 1~1000 이내의 숫자로 수치화시켰다. 그의 의식 지도에 따르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20 레벨의 수준으로, 모든 의식 수준 중 최하위 의식 레벨로 책정된다.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그 밤의 주접이 이불킥 수준의 수치심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만, 나를 마구 할퀴는 이 창살 끝이 내 심장 끝에 닿아 존재를 위협할 것 같다면, 공포감을 가지기도 무섭게 추하기 짝이 없는 왜곡의 세계로 다시 빠져 들어간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기꺼이 창살 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라는 연약한 동물이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하물며 개인도 그 순간을 도피하고 싶어 죽을 똥을 싸는데, 그것이 '우리'라는 관계에 있다면, 혹은 조직이라면? 사회라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이 공고할수록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게 되기 마련이다. 시스템의 안전함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공포스럽겠는가. 더군다나 내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는 보호까지 있으니 말이다. 그럴수록 시스템 안의 개인은 있는 힘껏 거부하고 힘을 다해 공격을 공격하는 길 밖엔 답이 없어진다. 나는 직업적 특성과 개인적 성격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는 왜곡을 공격할 일이 잦은데, 그 순간 돌아오는 나를 향한 창살에 의연한 척하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순식간에 저 강 너머로 순간이동해서 아무도 못 보는 풀숲 속에 숨어 오들오들 떨고 있다. 그만큼 진실에 상응하는 공격은 무섭다.
실체를 본다는 것은 자신이 마주해야 할 수치심과 맞닿아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고 싶다면 존재 위기의 단면에 존재의 근본이 있으리라 여기고 치열하게, 그리고 기꺼이 수치심을 맞이해야만 한다. 다시금 「의식혁명」을 인용하자면 '지혜를 얻는 것은 더디고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오직 괴로움뿐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의식에 진화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시스템에 진보는 없었을 것이다.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의 통로를 지나면 명쾌한 실체를 만난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 단, 전제는 내가 차는 '이불킥' 앞에 거짓이나 왜곡을 쌓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다. 진실을 향한 길에는 타협이 없다는 확신만이 거짓말하지 않게 만들고 진짜를 눈앞에 내놓게 한다. 뉴스라면 학을 떼며 싫어하는 내가 오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뉴스를 보면서 '나'와, 내가 속해있는 '조직',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이 '지구'를 수치스러워하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부정하는 길만이 답이라고, 희망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